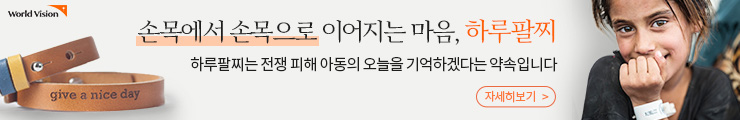

해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뉴스가 있다. 논밭에서 일하던 노인이 쓰러지고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은 이가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다. 폭염은 자연재해이지만 그 피해는 인간의 태도와 대응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폭염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먼저, 구조적인 경계심 부족이다. 우리 사회는 태풍이나 폭설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반응하면서도, 폭염에 대해서는 어딘가 모르게 "참으면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 많은 고령층은 폭염 속에서도 농사일을 멈추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순히 생활 때문만은 아니다. 폭염이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경각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매년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지자체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냉방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을 겨냥한 대책이 오히려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셋째, 통계와 자료에만 의존하는 형식적 행정이 문제다. 예를 들어, 온열질환자 수가 줄었다고 발표되면 이는 곧 성과로 포장된다. 하지만 이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았거나 신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체감 온도를 반영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통계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명확해진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1,276명, 사망자는 20명이었다. 2024년에는 환자 수가 1,110명, 사망자 34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25년은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환자 수 2,868명, 사망자 16명에 이르며,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전년도 수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경북 지역의 경우도 2024년에는 사망자 5명, 환자 수 141명이었지만,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사망자 3명, 환자 수 284명에 달한다.
기상청은 올해 8월에도 기록적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날씨가 아니라 대응이다. 피해는 예고돼 있고, 반복돼 왔다.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 전체가 폭염을 진정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여름에도 우리는 똑같은 기사를 또 읽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