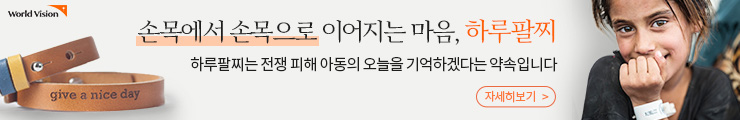
![[꾸미기]KakaoTalk_20250603_111512673.jpg](/data/tmp/2506/20250603111927_wadpnpuy.jpg)
오늘로 대선일정은 끝이났다.
치열했던 대선기간중 유독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것이 각 후보 캠프에서 앞다투어 ‘○○특보’, ‘○○위원장’, ‘○○보좌관’ 등으로 마구잡이로 뿌린 임명장이다. 이는 마치 정치판이 전국 단위의 ‘명함 뿌리기 경연장’이라도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일부 후보 캠프에서는 하루에 수십 명씩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캠프 간판 앞에 지지자들을 줄 세워 세운 뒤, 후보 또는 측근이 직접 임명장을 건네며 “이제부터 우리 조직의 일원입니다”라고 외쳤다. 수여 대상은 지역 유지, 동문 선배, 향우회 인사, 직능단체 관계자까지 그 폭이 넓다. 경중은 없다. 때로는 “지원만 하면 누구나 임명받을 수 있다”는 식의 캠프 홍보가 공공연히 돌기도 한다.
겉으로는 조직 확대를 위한 ‘인재 영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이른바 임명장 수여는 정치적 충성도, 또는 선거자금 지원 여부, 지역에서의 영향력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다시 말해, ‘누구냐’보다 ‘어디서 왔느냐’, ‘얼마나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셈이다. 어떤 후보 캠프에서는 심지어 일회성 단체사진을 위한 ‘임시 위촉’이 있었다는 후문도 들린다. 이쯤 되면, 임명장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임명장은 원래 무엇이어야 하는가. 임명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당신을 우리 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야 한다. 그것은 한 조직의 철학과 기준, 공적 책임이 담긴 상징이어야 한다.
특히 정치 조직 내에서 주어지는 임명장은, 그 수여 자체로 해당 인물에게 일정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인선은 공정한 기준과 일정한 검증을 수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난무하는 임명장은 그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물론 선거 조직의 확장은 현실 정치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다. 캠프 조직이 크면 클수록 지역 기반 확보에 유리하고, 조직을 통해 표의 흐름을 가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직함의 값어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며 숫자놀음만 벌이는 데 있다. 그 결과, 공직이 갖는 상징성과 직무의 실질적 무게는 실종되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또 한 번 추락한다.
일각에서는 “임명장 남발이야 선거철마다 있어왔던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예년과는 결이 다르다. 각 캠프가 ‘임명장 발급기’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조직의 질적 강화보다 양적 확장을 우선시하는 모습, 정치참여보다는 사진과 SNS 홍보용 이벤트로 활용되는 행태는 결코 묵과할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이처럼 비공식 직함의 무분별한 사용은 정치의 품격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공직 신뢰 자체를 갉아먹는 위험 요소다.
임명장을 받은 사람은 향후 해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연스럽게 직책 확대나 관변 조직 내 기용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불만과 분열로 이어지며, 선거 이후 캠프 내부에서조차 갈등을 유발한다. 이는 정치 안정성의 관점에서도 치명적이다.
정치는 본디 사람의 예술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단지 후보 옆에 서서 임명장을 들고 사진을 찍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정치란 더 이상 공공성을 담보한 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저 지분 분배와 장식용 명함이 오가는 ‘정치 장터’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라도 각 캠프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직책은 정말 필요한 자리인가?’,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맡을 자격이 충분한가?’라고 말이다.
조직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인선의 기준이다. 정치의 진정성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가볍게 준 명함은 결국 무겁게 돌아온다.
임명장은 결코 캠프 장식용 종이가 아니다. 그것은 신뢰와 책임의 무게를 함께 안은 정치적 약속이다. 명함은 가볍지만, 정치는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된다.